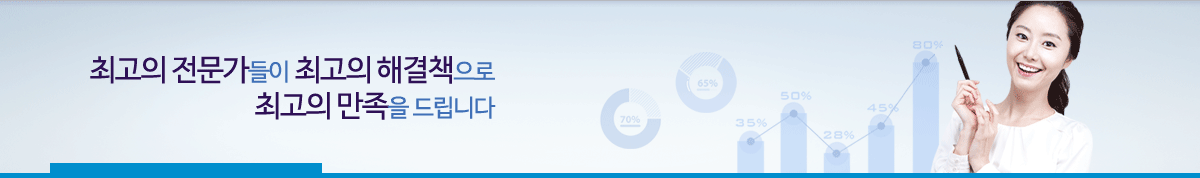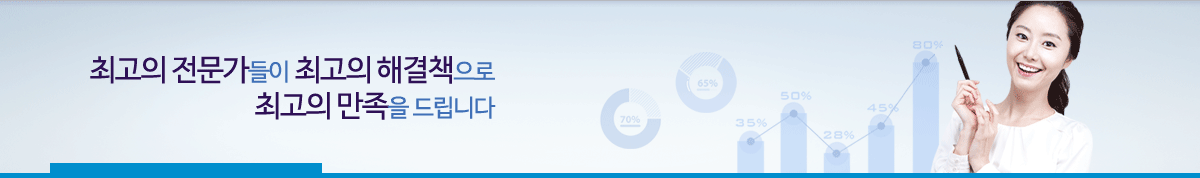헌법재판소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의 '해고예고 예외'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3호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한 제도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이와 별개의 해고예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문제가 된 해당 조항 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예외로 했다.
헌재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배제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측면에서 해고를 규율하는 것일 뿐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관계의 성질과 관계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