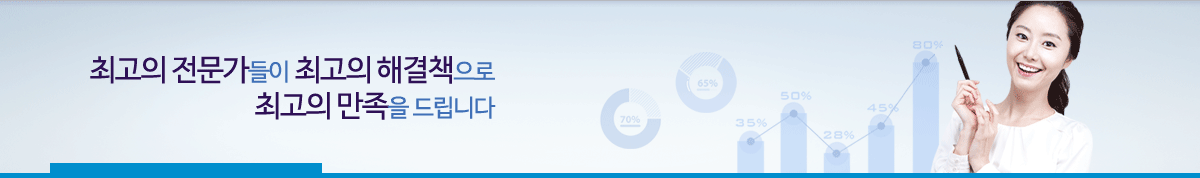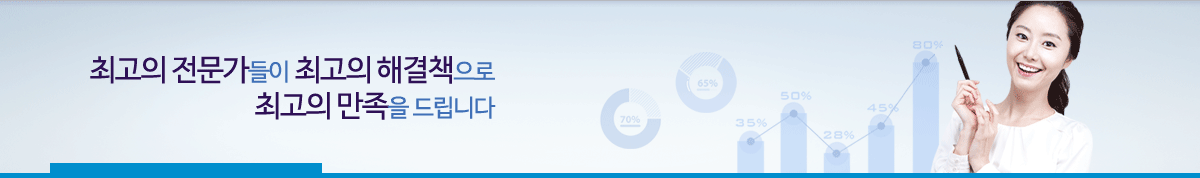계약의 형태 및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고용차별개선과-1801, 2013.9.16.)
【질 의】
2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도급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과거 기간제 근로계약과 새로이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무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을 것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수급인(실질적으로는 파견사업주)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2년) 제한 규정을 회피·면탈할 목적으로 파견근로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적으로는 파견사업주가 채용 등 인사, 계약기간 결정, 임금 및 교육훈련, 그 밖에 노무관리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로서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서울고등법원 2013.2.27. 선고 2012나59376 참조).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그 계약의 형태 및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